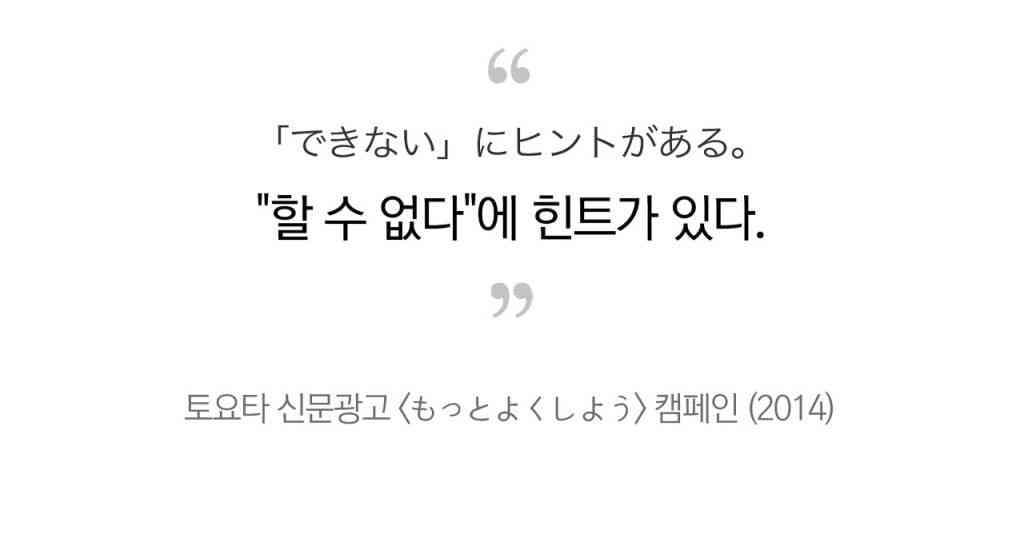
tvN의 ‘알쓸’ 시리즈를 좋아한다. 이 교양 예능 시리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적인 수다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알쓸신잡, 즉,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 여러 편의 시리즈로 나왔고, 범죄 이야기만 다룬 알쓸범잡, 인물중심으로 전개한 ‘알쓸인잡’ 등 나오는 방송마다 인기를 끌었다.
기획도 좋았지만, 시리즈의 잇따른 성공에는 훌륭한 패널들의 몫이 컸다. 자신의 전문분야는 기본이고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다. 게다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도 뛰어났다. 유시민, 정재승, 김영하 등 원래부터 유명했던 출연자도 많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이다. 나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김교수의 팬이 됐다. 그의 저서를 읽으면서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자연과학에 대해서 흥미도 갖게 됐다. 맥주 광고에까지 진출한 걸 보면, 이 시리즈를 통해 김교수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호감이 많이 커진 것 같다.

재미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특히, 2022년 12월30일 방송에서 소개된 것은 큰 울림을 주었다. 물리학자 슈뢰딩거의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책은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생명현상”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부제처럼 전혀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 대담한 의견을 낸 책이다. 슈뢰딩거는 DNA가 밝혀지기도 전인 1940년대에 자신의 물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생명현상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발견된 사실에 매우 근접한 추론까지 해냈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 중에는 실수도, 치명적인 오류도 있었다고 한다.


학문의 세계에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서는 연구와 저작활동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한다. 자칫하다가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자신의 전공분야에만 갇혀 있으면 새로운 발상과 시각으로 더 큰 발전을 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오류가 있는 연구라도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슈뢰딩거도 위의 책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매우 좁은 전문분야를 넘어서서 세계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중략)… 이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여러가지 사실과 이론들을 종합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 말고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p.18)
세상의 전진을 위해서는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이 필요하다. 실패의 가능성을 기꺼이 끌어안고 전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마음과 용기는 개인이 온전히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실패를 공동의 자산으로 포용할 때 수많은 도전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 실패를 포용함으로써 성공이 만들어진다는 믿음. 한참 전에 게재된 토요타의 광고 시리즈 중 하나가 생각났다.

「できない」にヒントがある。
“할 수 없다”에 힌트가 있다.
2014년에 나온 토요타의 “もっとよくしよう。”( 조금 더 좋게 하자) 캠페인은 상징적인 이미지와 감각적인 카피로 여러 편이 연재되었다. 그중에서 내 눈에 가장 걸리는 것은 바로 이 작품이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 잎사귀를 먹는 기린의 모습. 반대편에 얼룩말이 서 있다. 키가 작은 얼룩말은 높은 나무 끝에 달린 잎사귀에 닿지 못한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탄 개, 개 위의 고양이, 고양이 위의 닭은 마침내 꼭대기 위에 닿게 된다.
“할 수 없어, 저기는 닿을 수 없는 곳이야”.
이 말을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나 실패로 규정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할 수 없어”에 귀 기울인다. “왜 할 수 없지”를 묻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할 수 없다”가 힌트가 된 것이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진보의 한 걸음이 디뎌진다. 이 광고의 바디카피는 바로 그 내용을 담아서 시작한다.
誰かの 「できない」 を追求すると、みんなの 「できる」 が見つかる。
누군가의 “할 수 없다”를 파고들면, 모두의 “할 수 있다”가 발견된다.
“할 수 없다”의 가치가 온전히 평가받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이상적인 상황은 대부분 우리의 기대 속에만 존재할지도 모른다. 현실 속에서는 “실수”, “실패”, “쓸데없는 짓”, “예산낭비” 등의 동의어가 되기 일쑤다. 나 역시 사회의 어느 영역에서는 “할 수 없다”를 실수나 실패로 규정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후배들이 가져 온 아이디어를 보며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 ‘이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단언한 적이 많지 않았을까 되돌아 보게 된다. 다르게 접근하는 법을 연습해 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정규영의 더 많은 생각이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