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미디어 ‘@BISCIT‘이 콘텐츠를 시작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고, 자잘한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시도하고 망하고 배우는 걸 반복한다. 이 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콘텐츠란 단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이 콘텐츠는 flex의 유튜브 채널 [비하인드 스코어]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 출연자
BISCIT 콘텐츠 디렉터 박종일
M/KT Insight Week 프로젝트 매니저 류수현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푸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팀이 있다. 비스킷 팀은 그 흔한 “이번엔 어떤 콘텐츠 만들까?”라는 질문부터 던지지 않는다. 대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지?”라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 문제에서 출발하니, 자연스럽게 그걸 해결하는 도구로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류수현 PM은 이렇게 말한다. “기본적인 건 내가 만들고, 부족한 건 배우고, 둘이서 안 되는 건 AI나 자동화 툴을 써요.” 즉, 개인의 역할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이 팀의 방식이다.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렇게 각자 PM처럼 기능하며, 콘텐츠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실험과 조율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무슨 콘텐츠 만들까?’가 아니에요.
콘텐츠를 보는 관점도 특별하다. 비스킷 팀은 콘텐츠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드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그 콘텐츠가 쌓였을 때 피드 전체가 만들어내는 인상, 브랜드의 톤과 방향성에 더 집중한다. 박종일 디렉터는 “우리가 심는 건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이에요”라고 말한다. 콘텐츠 하나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피드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들은 공급자의 관점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 만드는 입장이 아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보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다.

결국 콘텐츠 하나가 아니라, 피드 전체가 브랜드를 말해요.
이런 철학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진다. 인스타그램 채널로 시작한 비스킷은 어느새 ‘원바이트 클럽’과 ‘인사이트 위크’ 같은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류수현 PM은 “온라인 콘텐츠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시간 내서 오프라인 자리에 직접 오는 건 정말 깊은 연결이에요”라고 말한다. 단순히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 역시 콘텐츠처럼 설계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참석자와의 밀도 높은 접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콘텐츠의 연장선에서 오프라인을 바라본다.
물론 모든 콘텐츠가 잘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팀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박종일 디렉터는 “콘텐츠 하나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브랜드도 콘텐츠도 유기체예요”라고 말한다. 썸네일, 문장, 색감 하나까지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쌓아가는 반복. 그게 브랜드의 톤을 만든다고 믿는다. 그래서 성과가 없더라도 너무 빨리 좌절하지 않는다. 한두 번 안 됐다고 포기하지 않고, 한 달 정도는 실험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간다. 그렇게 브랜드의 이미지와 태도가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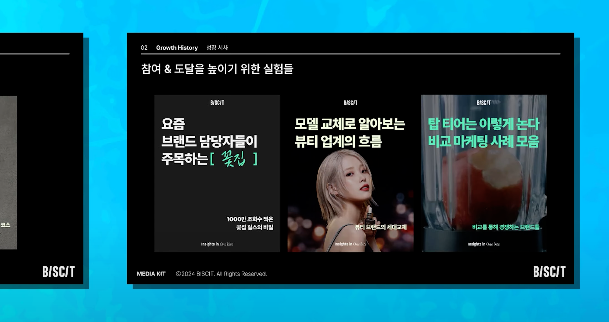
지금 비스킷 팀은 또 다른 실험을 준비 중이다.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깊은 대화와 경험들을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까. 흔한 후기 콘텐츠 말고,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한다. 또 다른 브랜드와 협업해 세션을 열거나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방식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 브랜드와 브랜드가 연결되면, 또 어떤 인사이트가 나올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콘텐츠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팀의 방식은 콘텐츠를 단순한 결과물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콘텐츠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고, 브랜드를 설명하는 언어이며, 관계를 만드는 도구다. 그래서 이들의 콘텐츠는 흘러가지 않고 쌓인다.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브랜드가 어떤 팀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숲을 키우듯 콘텐츠를 쌓아가는 팀, 비스킷의 다음 실험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 인사이트 가득한 마케팅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고 싶다면 👉 위픽레터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