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되나요??”
망설임 끝에 고객이 던진 이 한마디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 질문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정보 입력, 예약 버튼, 옵션 체크. 단 세 번의 클릭이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고객은 그 세 번의 클릭 앞에서 수많은 질문과 불안으로 멈춰 섭니다. 왜일까요?
그러고 보니 뉴스나 SNS에 키오스크 앞에서 똑같이 헤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고?” 라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키오스크이면서, 동시에 불편한 키오스크 앞에 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동화의 역설: 편해진 건 시스템뿐🤖
자동화의 역설: 편해진 건 시스템뿐🤖
여행업계의 자동화는 2000년대 초 OTA(온라인 여행사)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같은 플랫폼이 “직접 예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고객을 스크린 앞에 세웠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이 흐름을 완전히 가속화시켰습니다.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비대면, 셀프서비스로 전환되었거든요.
지난 5년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NDC API가 항공사와 여행사를 직접 연결했고, 통합 플랫폼이 호텔부터 액티비티까지 한 번에 처리하기 시작했죠. AI는 24시간 내내 여행 일정을 짜주고, 앱 하나로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완료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스템은 똑똑해졌는데, 고객 문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문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
과거: “발리 5일 패키지 얼마인가요?”
-
현재: “여기서 뭘 클릭해야 하나요?”
절차는 줄었지만, 설명해야 할 것은 여러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누구를 위한 효율인가?⚖️
누구를 위한 효율인가?⚖️
문제는 ‘누구의 관점에서 편리한가’에 있습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분명 효율적입니다. 예전에 직원이 몇십 분 걸려 처리하던 예약을, 이제 고객이 5분 만에 스스로 해결하니까요.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도 완벽합니다. 데이터는 정확하고, 실수는 줄었고, 처리 속도는 배로 빨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고객 입장은 다릅니다. 예전엔 “발리 가고 싶다”고 말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영문 스펠링부터 희망하는 시간까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실수하면 “고객님이 잘못 입력하셨네요”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죠.
물론,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최저가 항공권이나 호텔을 재빨리 선점하는 ‘디지털 전문가’ 같은 고객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앞둔 대부분의 평범한 고객에게, 이 과정은 편리해진 게 아니라 낯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에 가깝습니다.

설명서를 읽어주는 우리의 현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진짜 하는 일은 ‘사용설명서 읽어주기’였다는 걸요.
“예약번호 입력하시고요…”
“여기에 여권정보 입력하시고요…”
“옵션은 여기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매일 수십 번 반복하는 이 말들, 솔직히 지겹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고객의 문제일까요?
 고객의 머릿속은 얼마나 복잡할까?🤯
고객의 머릿속은 얼마나 복잡할까?🤯
고객에게 여행 예약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낯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루에 수십 번 하는 익숙한 루틴이죠. 이 인식의 차이를 ‘전문가의 저주’가 아닐까요? 너무 잘 알아서 모르는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인지부하입니다. 여행 예약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량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옵니다. 여권번호, 영문명, 좌석 선호, 식사 옵션, 수하물 규정, 체크인 방식…
각각은 간단해 보이지만, 연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객에게는 결정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용어가 낯설 때 더욱 그렇죠.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뭔지, 더블과 트윈룸의 차이가 뭔지, 고객이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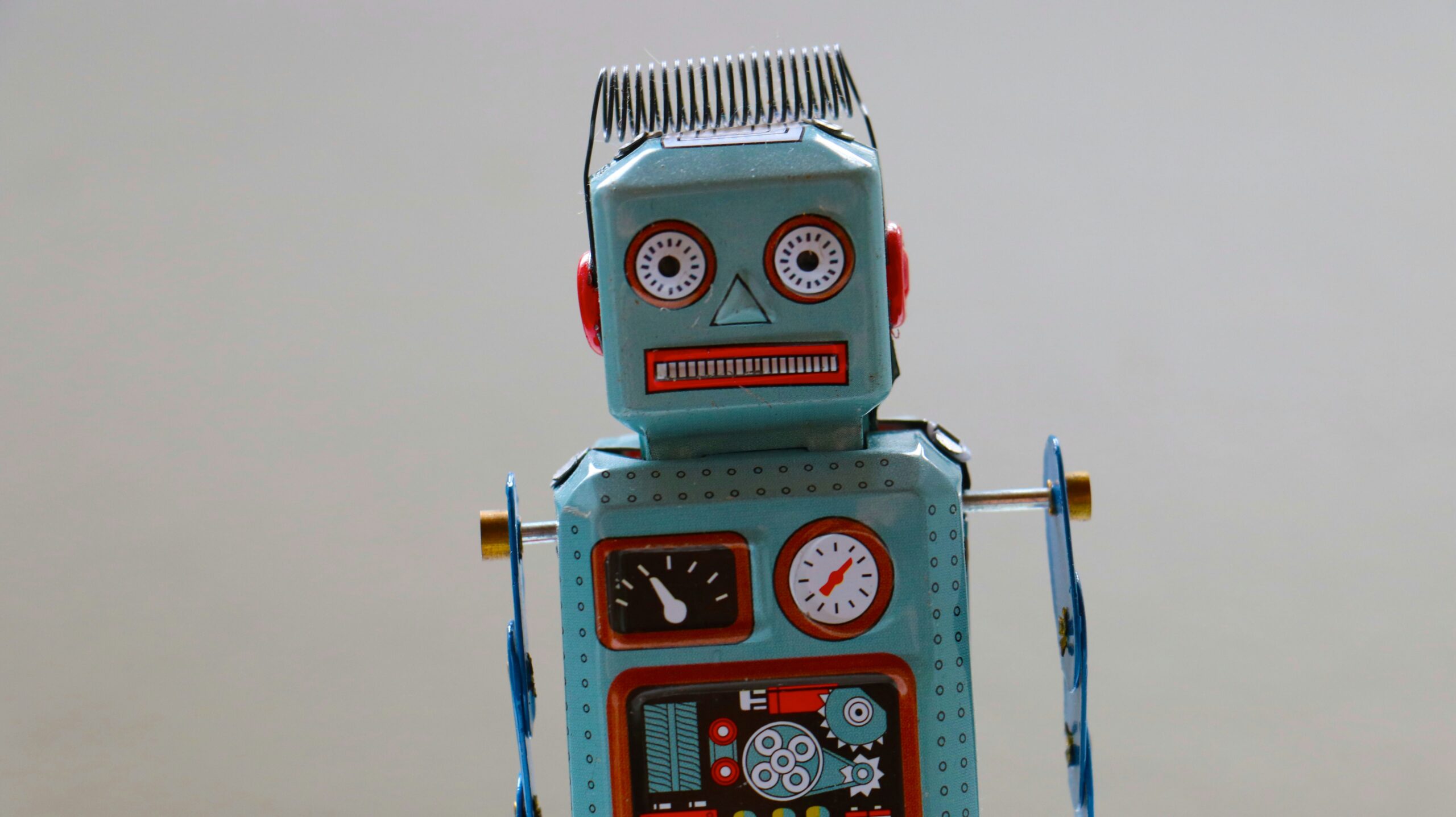 자동화가 놓친 것: 맥락과 감정❤️🩹
자동화가 놓친 것: 맥락과 감정❤️🩹
기술은 절차의 효율성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여정에는 감정의 효율성도 중요해요.
관광은 상품이 아닌 경험을 파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자동화는 그 경험을 단순한 절차로 축소시켜버렸어요. “여행을 떠난다”는 설렘이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업무가 되어버린 거죠.
-
불안: “이렇게 해도 될까?”
-
혼란: “이 많은 옵션 중 뭘 선택해야 하지?”
-
좌절: “왜 자꾸 에러가 날까?”
시스템은 이런 감정을 읽지 못합니다. 에러 메시지로 “입력값이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뜨지만, 정작 고객이 궁금한 건 “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예요.
기술은 정답을 제공하지만, 고객은 안심을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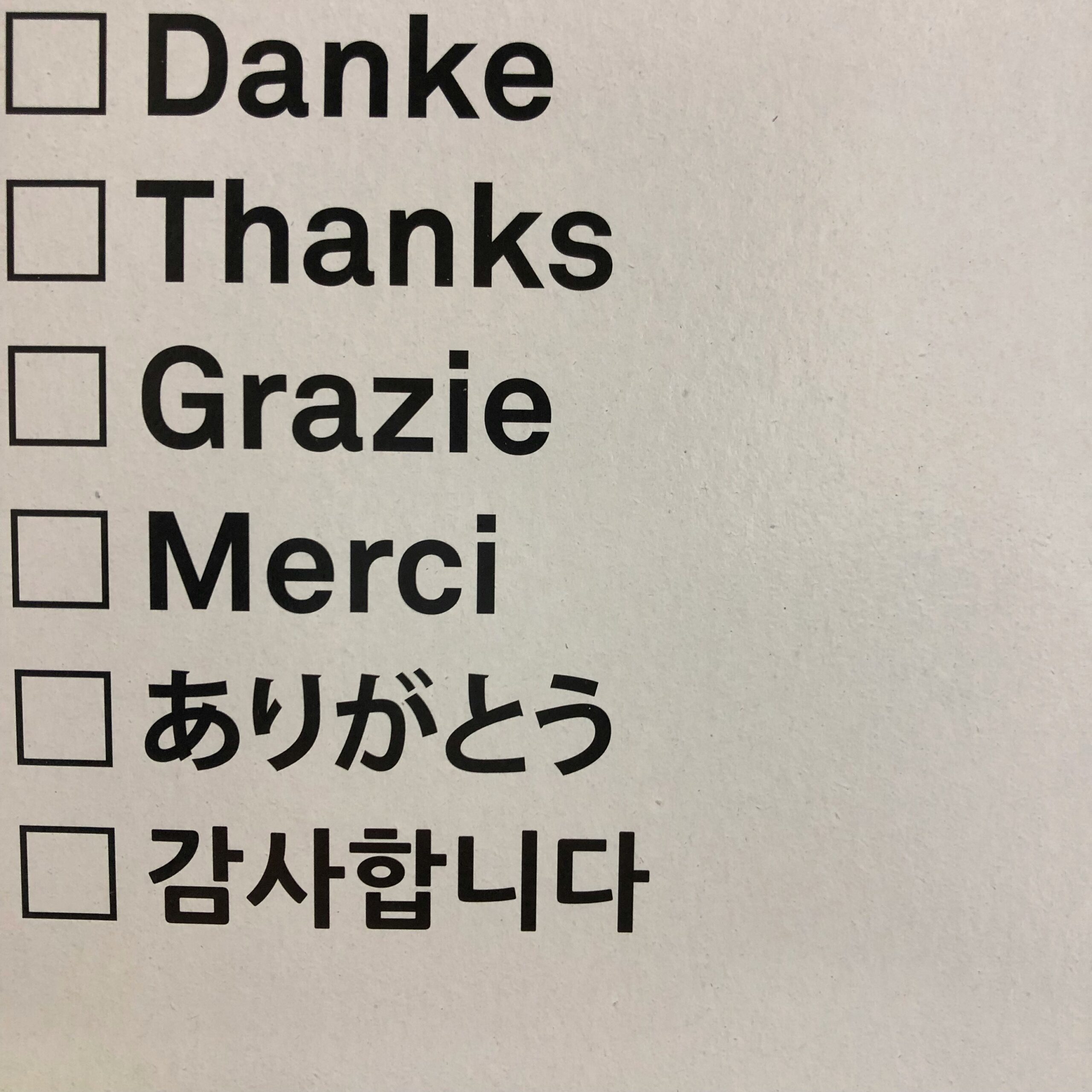 우리는 키오스크가 아니라 ‘번역가’입니다 💡
우리는 키오스크가 아니라 ‘번역가’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불편한 키오스크’일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키오스크가 아니라 번역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스템 언어를 인간 언어로, 절차를 맥락으로, 불안을 안심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죠.
-
키오스크는 같은 답을 반복하지만, 번역가는 상황에 맞는 설명을 찾습니다.
-
키오스크는 정확성만 추구하지만, 번역가는 이해도를 높입니다.
-
키오스크는 완료 여부만 확인하지만, 번역가는 과정의 불안까지 챙깁니다.
번역가의 실천 매뉴얼: 디테일의 힘 ✅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시스템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는 힘은 거창한 기술이 아닌, 대화의 순서와 단어를 바꾸는 작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1. ‘절차’를 ‘맥락’으로 번역하기
“여권주세요” → “항공좌석과 호텔 좌석을 확보하기위한 여권정보가 필요합니다”
2. ‘불안’을 ‘안심’으로 번역하기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좌석을 직접 보시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번호는 [예약번호]입니다. 혹시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바로 다시 말씀해주세요.”
3. ‘감정’을 ‘공감’으로 번역하기
“복잡해 보이죠? 제가 창을 켜서 같이 봐드릴게요”
4. ‘기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기
“지금 시스템이 좀 느려서 1~2분 걸릴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처럼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데이터 입력’이라는 차가운 과업을, ‘나의 여행을 누군가 함께 준비해주고 있다’는 따뜻한 경험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현실적 한계😮💨
그럼에도 현실적 한계😮💨
물론 우리가 ‘섬세한 번역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효율적인 해결사’의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솔직히 말해, 하루 수십 건의 예약을 처리하며 매번 완벽한 번역을 제공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와 회사의 효율성 목표 또한 우리가 존중해야 할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현명한 오퍼레이터는 아마 두 개의 모자를 번갈아 쓰는 사람일 겁니다.
-
평상시에는 ‘효율적인 해결사’로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처리합니다.
-
하지만 고객이 기술의 벽 앞에서 길을 잃는 순간, ‘섬세한 번역가’의 모자로 바꿔 쓰고 그의 옆에 섭니다.
모든 순간에 완벽한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고객이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을 알아보고, 그때만큼은 온전히 집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이 아닐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 인간다운 서비스의 가치가 더 분명해진다고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 인간다운 서비스의 가치가 더 분명해진다고요.
기계가 주는 정확함과 사람이 주는 안심.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지금 시대 여행 오퍼레이터의 새로운 정체성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불편한 키오스크가 아닙니다.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똑똑한 번역가입니다.
그리고 그 번역 능력이야말로,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 아닐까요?
이미지출처: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