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죽음
2018년, 나이키의 “just do it” 10주년을 기해 론칭되었던 “beleive in something” 캠페인은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미국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 (NFL의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경기에서 미국 국가 제창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었던 선수)를 기용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단순한 제품을 넘어, 브랜드의 목소리와 시각 (point of view)을 어떻게 현 사회와 소통하는지,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살아 있는 유기적 (organic) 존재인지 더욱 강렬하게 새겨 주는 계기가 되었다. 2년 뒤 미국을 기점으로 일어났던 BLM (Black Life Matters)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음도 자명할 것이다.
나이키는 2020년도에도 일본계 미국인 테니스 선수인 나오미 오사카를 주인공으로 한 “Don’t change yourself” 캠페인을 론칭했다. 일본계 미국인이고 혼혈의 외모인 나오미를 두고 일본인인지 아닌지 설왕설래가 오간 일본 사회에 던진 질문이었으나, 이 광고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를 휩쓸었던 nationalism (돌아온 국수주의라고 해야 할까?)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단순히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닌, 동시대에 필요한 화두를 “스포츠”라는 범세계적인 주제를 통해 던져 주는 몇 안 되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브랜드로서 확실한 위치를 소비자들에게 계속 자리매김하게 하지 않았을까.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활황을 맞으며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상품을 더 잘 알리기 위한 제조사들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맞아떨어졌고, tv와 라디오 등 대중 매체의 보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광고“가 기업화되고 상품의 특징 – 어머 저거 사야 해! 를 불러일으키는 – 을 매체에 잘 녹여 전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광고대행업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상품, 그 제품의 자매품 등을 다른 유사제품들과 차별화되도록 하는 ”브랜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을 터이고 피앤지나 유니레버 같은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에서는 ”브랜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과 부서를 만들어 제품과 유통, 프로모션 전략뿐 아니라 브랜드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도 세우도록 하는 일을 맡겼다. 사람도, 기업도, 브랜드도 ”중장기적 성장“은 백년지대계가 필요한 일이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 즉 이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할 터. 그런 브랜드의 비전을 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는 이런 이런 것을 지향합니다라고 알리려면 교장 선생님 훈화말씀처럼 따분한 글귀들의 나열로는 소비자들의 마음은커녕 관심을 1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무수한 브랜드 매니저들은 알았을 것이다.
인간이 “말”로 대화하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다는 “스토리”, 즉 이야기만큼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인 툴도 없을 것이다. 권선징악 교훈만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얘들아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단다 “라고만 하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겠지만,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같은 ”이야기“ 가 가미되면, 마치 내가 흥부이고 콩쥐인 것처럼 이입되어 정신없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선징악“이라는 이야기의 핵심 – 즉 아이들을 착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비전- 이 아이들에게 남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브랜드의 비전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해 온 뛰어난 이야기꾼 브랜드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맥킨토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를 마치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처럼 표현했던 1984년 애플의 맥킨토시 광고. Microsoft는 너드들이 사용하고, 맥킨토시는 세련된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비교광고를 재미있게 풀어냈던 2006년의 광고. 이후에도 애플 광고는 다른 테크 브랜드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마케팅 목적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내 왔다.
전 세계인들이 인종의 벽을 넘어 코카콜라로 하나가 된다는, 당시로서는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이었던 1970년대 코카콜라의 hilltop 캠페인. 어떤 보이스오버도 없이 빨간 머플러를 두른 북극곰 가족이 맛있게 코카콜라를 마시는 모습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어필한 ‘폴라 베어 캠페인’ 등, 범세계적이면서도 각국 소비자들의 인사이트에 맞는 스토리를 선보여 온 코카콜라.
앞서 언급한 나이키 역시 타이거 우즈, 마이클 조던 등 스포츠 아이콘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양한 스토리로 시대를 넘나드는 스토리마케팅을 이룩해 온 브랜드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말이다. 요즘은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브랜드의 ‘스토리 텔링’이 있었던가? 스토리보다는 이미지 시각화에 강한 패션 브랜드들 -발렌시아가, 구찌 등-과 슈퍼볼 때만 반짝하는 주로 코믹 소재의 미국 브랜드 광고들, 그리고 칸느를 비롯한 세계적 광고제에서는 NGO 단체들의 CSR 적 캠페인들이 수상한 지도 이미 십수 년이다.
기업들이 스토리가 더 이상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린 걸까? 아니면 급성장한 테크 기업들이 브랜드의 중장기적 성장보다는 당장의 이용률 증가를 통한 주가 성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일까? 테슬라, 메타 같은 21세기형 주각 주도 브랜드들은 더 이상 브랜드 자체의 스토리가 아니라, CEO 나 founder의 개인 스토리 – 기행이든 무엇이든 – 가 더 중요한 동력이 되었기 때문일까.




SAVVY의 브런치 스토리: https://brunch.co.kr/@sunahb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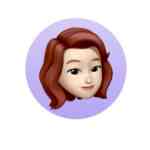


아 정말 그런 것 처럼 보이네요! 그런 시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