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답’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사유의 시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문득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기술의 목적이 효율과 정답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답의 속도에 감탄하는 사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감각은 서서히 무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빠른 AI 검색엔진 중 하나인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크린을 벗어나, 서울 강남 한복판에 오프라인 공간 ‘Cafe Curious’를 열었습니다. 기술의 효율이 아닌 커피 향으로 문을 여는, '탐구형 카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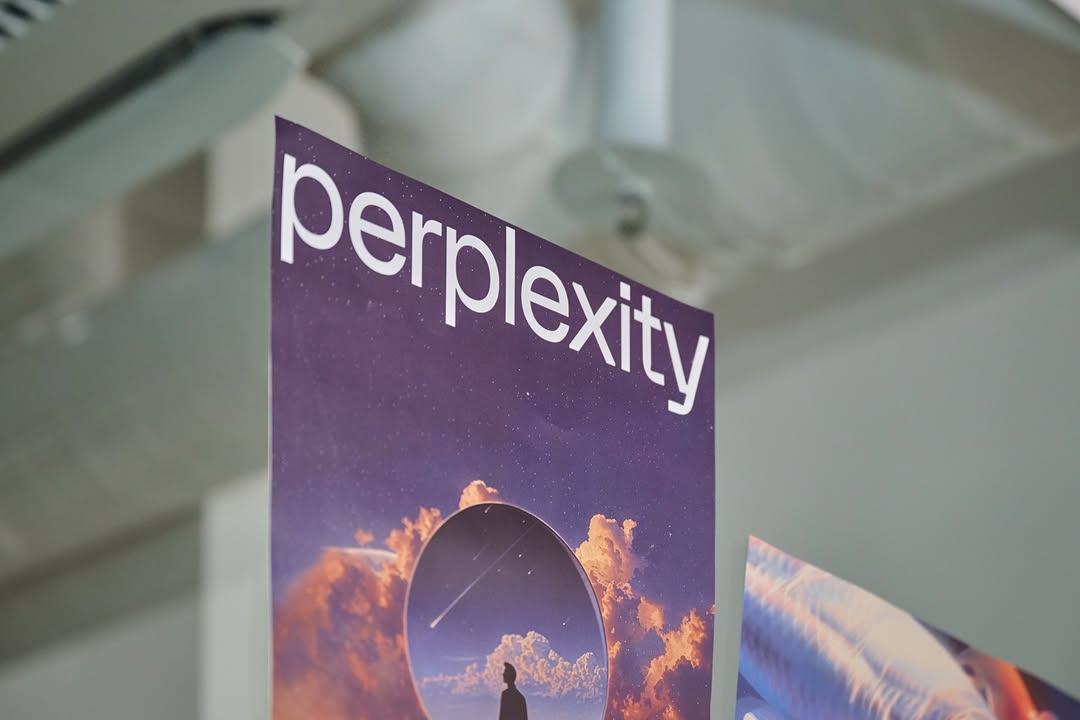
☕️답이 아닌, ‘탐색의 과정’을 팔다
기술 브랜드가 물리적 공간을 연다는 건 낯선 일입니다. 하지만 퍼플렉시티는 이 낯섦을 가장 강력한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브랜드 메세지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Stay Curious(호기심을 유지하라)'
이 공간의 목적은 '정답'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순간보다, 사용자가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 그 자체를 브랜드 경험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AI가 효율의 상징이었다면, Cafe Curious는 사유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실험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머물고, 대화하고, 우연히 새로운 영감을 만납니다. 퍼플렉시티가 목표한 것은 AI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바로 이 ‘사유의 일상화’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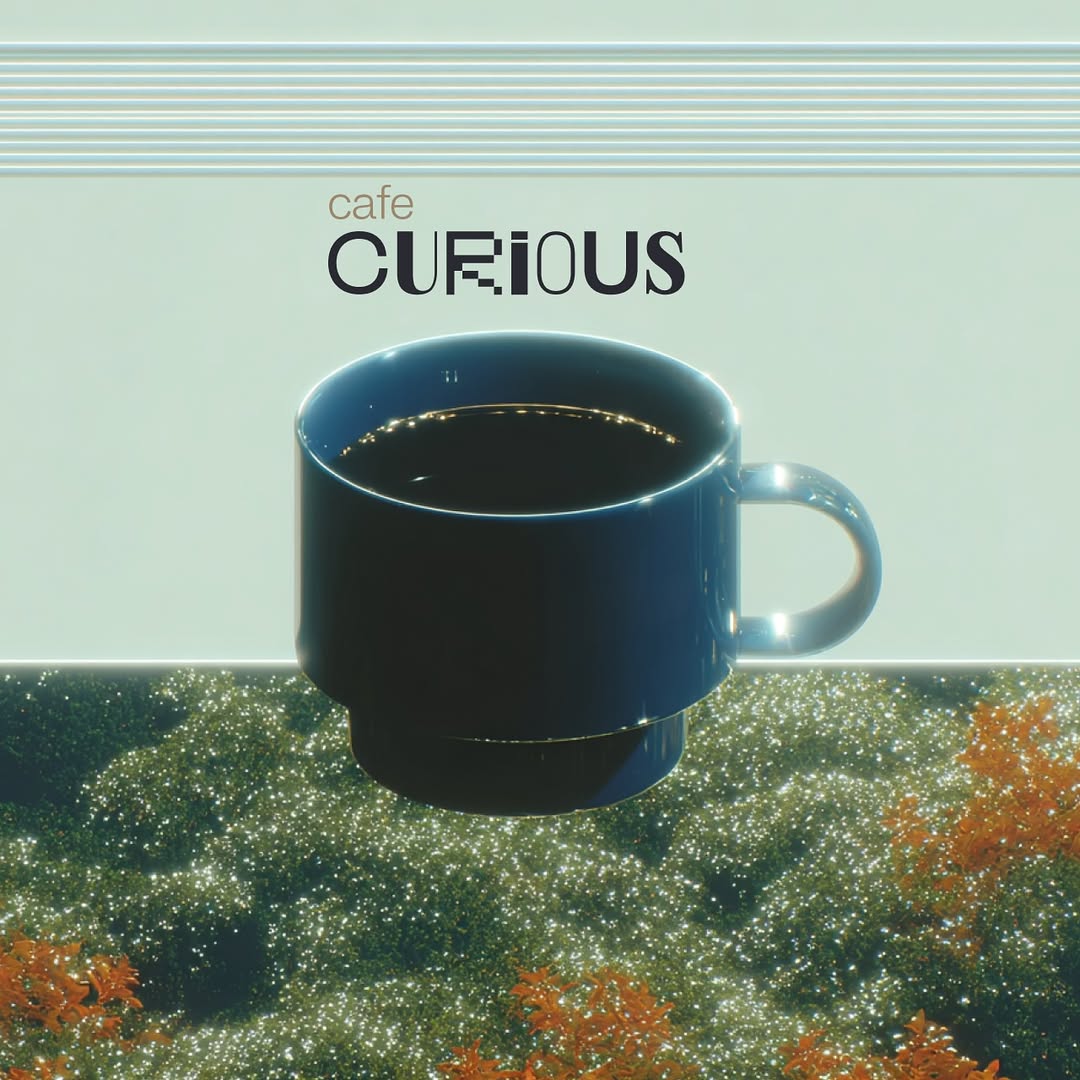
🧭검색이 ‘공간 언어’로 번역될 때
이곳에서 검색은 스크롤이나 타이핑이 아닙니다. 방문객의 동선은 ‘질문 → 탐색 → 대화’라는 인간적인 흐름으로 재구성됩니다.
테이블에서 궁금증을 떠올리고, 지하 체험존에서 서비스를 만져보며, 다시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경험을 공유합니다. 비물리적 ‘검색’이 감각의 ‘공간 언어’로 번역됩니다.
‘검색 → 체험 → 구독’이라는 퍼플렉시티의 온라인 퍼널이 오프라인 공간의 리듬으로 재구성된 셈입니다.
이 실험은 전시가 아니라, 전환의 설계입니다. 방문객은 현장에서 유료 검색을 시험하고, 자연스럽게 구독으로 연결됩니다. 프로 구독자에게는 음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탐구의 경험이 곧 전환의 구조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 기술은 집사, 무대 위는 인간
이 실험이 인상적인 이유는 AI의 역할을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AI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Cafe Curious’에서 AI는 카페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주문을 받거나 커피를 내리는 대신, 사람들의 질문을 끌어내고 대화를 이어주는 ‘호기심 파트너’로 작동합니다. AI가 선곡한 사운드가 공간을 채우지만, 그 공간의 중심을 채우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대화와 사유입니다.
기술은 뒤에서 흐름을 조율하고, 무대 위는 인간의 감정이 채웁니다.
퍼플렉시티는 기술의 냉정함을 문화의 온도로 중화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사유의 공간'을 제안한 것입니다.

💡경험이 질문이 될 때
Cafe Curious는 AI로 ‘정답’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질문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정답 대신 탐구의 과정을 경험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체류와 대화, 그리고 구독이 뒤따릅니다.
퍼플렉시티는 기술을 판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태도'를 팔았습니다. AI를 효율의 도구가 아닌, 사유의 동행자로 정의했습니다.
썸네일, 본문 이미지출처: 퍼플렉시티, Cafe Curious

